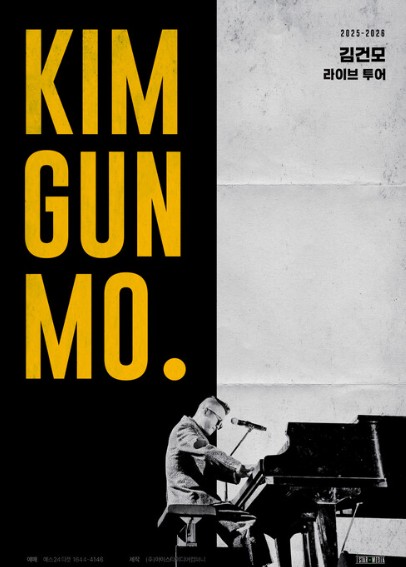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여당 단독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다. 재상정된 이번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의 파업까지 인정하는 한편,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이른바 ‘더 센 규제’로 불리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기업 경영 환경과 노동시장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노동계는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진전된 입법”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경제계는 “기업의 정당한 손해 회복 수단을 제약하고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은 기업 입장에서 법적 대응 수단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경우, 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고용 유연성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중견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파업은 권리지만, 손실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면 경영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고 말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원청-하청 구조가 복잡한 우리 산업 특성상, 간접 고용 근로자까지 사용자로 인정받게 되면 노동쟁의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이는 노사 갈등이 원청 기업으로 직격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 고용 회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노동 유연성을 해치는 법안이 반복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방패를 쥐여주는 조치”라며 “지속가능한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은 유럽 주요국과 유사한 ‘간접고용 보호’ 모델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현실에 맞는 적용 기준 마련과 노동계의 책임 있는 대응 없이는 사회적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